금융사고 터질 때마다 “CEO 제재 필요” 강조정작 교수 때는 “당국 실책도 돌아봐야” 언급기관 제재 효과도 크지만 경영진 징계만 강조노골적인 CEO 징계론에 ‘윤석헌 포비아’ 확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손태승 회장의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손 회장 임기만료일)까지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 측은 현재 손 회장에게 징계안이 최종 통보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기가 모호한 만큼 오는 3월 중으로 징계안 통보가 이뤄지면 그때 손 회장 연임에 대한 정확한 의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결정된 지배구조 관련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손 회장의 연임을 결의한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지지한 셈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30일 개최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고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징계 의결안에 서명함으로써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문책경고는 징계 당사자에게 조치가 통보된 날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다.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인 우리은행 기관 제재안과 함께 통보되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초·중순께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두차례 정례회의를 셜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3월 정례회의는 4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3월 첫정례회의 때 DLF제재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측은 제재안이 의결되고 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3월24일로 예정된 주총 전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에 대한 제재 효력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에대한 비판여론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학자 시절부터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징벌적 제재에 찬성했던 윤 원장이 감독당국 수장 취임 후 CEO들에게 노골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서 공포감만 더 커졌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DLF 사태에 대해 기관 제재만 강경하게 다루고 개인 제재를 다소 가볍게 다뤘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잡음 없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윤 원장의 ‘CEO 제재 지론’이 손 회장 거취 문제까지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여러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회사 경영의 정점에 있는 CEO가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DLF 사태에 대한 징계 논의 국면에서도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CEO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행권의 키코 사태 배상 문제를 언급할 때도 “은행이 고객을 망하게 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론을 폈다.
물론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여론도 있지만 윤 원장이 직접 나서서 CEO 등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공포감 조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오죽하면 ‘윤석헌 포비아’라는 말이 금융권에 돌 정도다.
무엇보다 이번 DLF 사태는 경영 계획 수행의 오류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기관 제재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제재로 인해 금융상품의 설계나 운영 미숙이 CEO 거취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생겼다고 꼬집는 여론도 만만찮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소비자 대상 손실 발생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위반사례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사법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금융 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 특히 CEO에게만 돌리는 모습도 윤 원장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학자 시절의 주장과 현재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은 윤 원장을 지지했던 이들까지도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윤 원장은 숭실대 교수 시절 금융 소비자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회사에게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도 실수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장이 되자 교수 시절의 주장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초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당시 금감원이 수백명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을 때 “경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분명히 클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징계만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 윤 원장이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 기조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의 경영 안정이 우선돼야 소비자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다”며 “CEO에 대한 강경 제재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감독당국의 책임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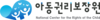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