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브랜드 작업 계속···업계 ‘계약 해지’ 무게삼성의 상징 SM시리즈 단종···르노모델 일원화
재계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 8월4일자로 만료되는 르노삼성의 브랜드 이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 2000년 르노에 삼성차를 매각하면서 10년 주기로 삼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 왔다. 르노삼성은 삼성 기술력이나 마케팅 노하우가 아닌, 이름만 빌려쓰며 매년 매출액의 0.8%를 브랜드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합작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예고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르노삼성은 2015년부터 전국 전시장 테마를 삼성 고유 컬러인 ‘파란색’에서 르노그룹 ‘노란색’으로 교체하며 르노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6년에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3’ 구매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 태풍 엠블럼이 아닌 르노 마름모 엠블럼을 부착해 판매했다. 지난해에는 르노 해치백 ‘클리오’를 출시하면서 르노삼성 세단을 상징하는 SM시리즈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최근 직원 이메일 주소를 르노삼성닷컴에서 르노닷컴으로 교체한 것도 독자 브랜드화의 일환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이 올해는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SM3’와 ‘SM5’, ‘SM7’을 모두 단종시켰다. 이로써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SM6’와 ‘QM6’ 2개 차종으로 줄게 된다.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크로스오버 SUV인 ‘XM3’를 포함하더라도 3개 차종에 불과하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동신모텍의 부산공장에서 위탁생산되고 있다.
부산공장에서는 현재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를 생산하고 있지만, 내년 초 계약이 종료된다. 연간 10만대 가량을 보장하던 로그의 수탁생산계약을 대체할 XM3 수출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르노삼성은 본사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일각에서는 XM3 물량을 따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해를 넘긴 올해 6월에 타결했다. 올해분 임금협상은 실무교섭만 진행했을 뿐 본교섭에는 착수조차 못했다. 임금인상 등 노조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한국으로 물량을 배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르노삼성이 출범 20주년인 내년에 선보이는 신차 6종 중 절반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차다. 신형 QM3와 전기차 조에, 상용차 마스터 등 ‘무늬만 국산차’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르노삼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어 단순 판매 창구가 될 가능성이 짙다.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생산량 감축에 대비해 인력 400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자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인력 전환 배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르노삼성이 삼성과 결별할 타이밍인 건 맞다”면서도 “삼성과 르노가 결별한다는 가정아래 삼성이 가진 브랜드 이미지 덕을 보고있는 르노가 독자적으로 소비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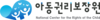
댓글